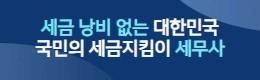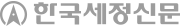국세청 고위직의 조로(早老)현상이 심각하다는 관가의 우려를 반영하듯, 실제로 고공단에 올라 퇴직하기까지 평균 재직기간이 4년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행기관인 국세청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자면, 다양한 국세행정을 익힌 후 행정의 질적 변화를 이끌 고위직으로 올라섰음에도 짧은 시간내 명퇴로 내몰리고 있다는 반증이다.
최장수 고공단 재직…김연근 전 서울청장 8년10개월
고공단 평균재직기간 임용구분별로 큰 편차
행시-5년2.5개월, 稅大-3년3개월, 일반(7급)-2년6개월
6년 이상 고공단 재직 12명 가운데 행시 출신이 11명
2년 미만 고공단 재직 10명 가운데 9명이 7급공채 출신
최근 6년간(2013~2018년) 퇴직한 국세청 고위공무원은 총 52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이들이 고공단으로 올라선 후 퇴직하기까지의 전체 고공단 재직기간은 평균 3년8.5개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대상은 2013년부터 2018년말까지 명예퇴직한 국세청 고위직(고공단 가급 및 나급 포함)들로, 정무직인 국세청장 재직기간은 제외했다.
취재 결과 최근 6년간 명예퇴직한 고공단의 임용구분별 재직기간은 △행정고시 27명-5년2.5개월 △세무대학 3명-3년3개월 △일반공채(7급) 15명-2년6개월 △육사 3명-4년11개월 △민간개방형직위 4명-2년 8개월 등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임용 출신별 명퇴자의 경우 고공단 진입에서 가장 앞선 행시 출신이 명퇴자 또한 가장 많이 배출했으며, 이들의 평균 고공단 재직기간은 5년2.5개월로 다른 임용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길었다.
최근 6년간 고공단으로 명예퇴직한 일반출신의 경우 9급 출신은 단 한명도 없고, 7급 출신만 15명으로 이들의 평균 재직기간은 2년6개월에 그치는 등 행시출신과 비교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다른 임용출신자들의 고공단 평균 재직기간에 비해서도 가장 짧았다.
세무대학 출신 고공단으로는 총 3명이 1급 지방청을 끝으로 물러난 가운데, 평균 재직기간은 3년3개월로 일반직에 비해서는 8개월 가량 재직기간이 길었으며, 지금 고공단에서는 찾을 수 없는 육사 출신 3명이 평균 4년11개월 재직한 것으로 집계돼 이색적이다.
민간개방형의 경우 본청내 감사관과 납보관 직위로, 통상 3년여의 임기가 부여되지만, 2014년 퇴직한 신호영 납보관이 1년10개월을 재직하고 물러난 탓에 전체 평균 재직기간이 2년8개월로 집계됐다.
이처럼 국세청 고공단의 평균 재직기간은 3년8.5개월, 임용출신별 재직기간은 천차만별로 나타난 가운데, 평균 이상의 장수(長壽)를 누린 고위직 또한 적지 않았다.
최근 6년간 고공단 퇴직자 52명 가운데 6년 이상 고공단으로 재직한 이는 12명으로, 원정희 부산청장을 제외하곤 모두가 행시 출신이었다.
특히 전체 고공단 퇴직자 가운데 최장수 재직자는 김연근 전 서울청장으로 8년10개월 동안 고공단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임용구분별 최장수 고공단은 행시출신의 경우 앞서 김연근 전 서울청장이 단연 앞섰으며, 세대의 경우 김재웅 전 중부청장이 4년6개월, 일반출신에서는 김봉래 전 국세청 차장이 5년을 고공단으로 재직하다 퇴임했다.
6년 이상 고공단으로 재직한 이들은 박만성 전 대구청장(6년5개월), 임경구 전 국세청 조사국장·심달훈 전 중부청장·서진욱 전 부산청장(6년6개월), 신동렬 전 대전청장(6년), 나동균 전 국세공무원교육원장(8년10개월), 김연근 전 서울청장(8년10개월), 원정희 전 부산청장(6년11개월), 임환수 전 국세청장(6년4개월, 서울청장 재직기간),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6년2개월),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6년), 김덕중 전 국세청장(6년3개월, 중부청장 재직기간) 등 12명이다.<퇴직연도 기준>
반면, 고공단 평균 재직기간인 3년8.5개월에 훨씬 못 미치는 등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이들도 상당했다.
고공단 재직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명퇴한 인원은 총 10명으로, 이들 가운데 남판우 국장을 제외하곤 9명 모두 7급 공채 출신인 점도 이채롭다.
임용구분별 최단기 고공단은 행시의 경우 남판우 전 중부청 징세송무국장(1년5개월), 세대에서는 김한년 전 부산청장(2년5개월), 일반출신의 경우 김충국 전 중부청 조사3국장(1년2개월)으로, 김 전 국장의 경우 전체 52명의 고공단 가운데서도 고위직 재직 기간이 가장 짧았다.

한편, 고공단 명퇴자들의 퇴직 시기를 '2013~2015년', '2016~2018년' 등 3년을 기준으로 재분류한 결과, 행정고시의 경우 1개월 가량 고공단 재직기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행시출신의 경우 2013~2015년에 12명이 명예퇴직한 가운데 이들의 재직기간은 평균 5년3개월 이었으나, 2016~2018년에는 이보다 많은 15명이 퇴직했으며 평균 재직기간도 1개월 단축된 5년2개월로 나타났다.
반면, 세대의 경우 평균 고공단 재직기간이 4개월 가량 늘었으며, 일반출신 또한 2개월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명퇴자는 크게 줄었다.
일반출신의 경우 2013~2015년 사이에 11명이 평균 2년5개월 고공단으로 재직한 후 퇴직했으나, 2016~2018년 들어 일반출신 고공단 명퇴자는 4명에 불과했다. 고공단 인력풀에서 일반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국세청 고공단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행시출신들의 재직기간이 이처럼 짧아짐에 따라, 국세청 상층부의 조로 현상이 갈수록 가속화되고 있다는 관가의 우려가 사실로 입증된 셈이다.
이 때문에 국세행정의 질적 변화를 이끌 국세청 고공단 인력의 낭비를 막기 위해선, '기관장 취임 후 명퇴'라는 인사 공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슬로우(Slow) 인사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대와 일반출신을 고위직으로 발탁하는 등 지금의 고공단 인력풀을 보다 다양화하는 것이 국세청 고위직 조로 현상을 늦출 수 있는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국세청 내부에서도 점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