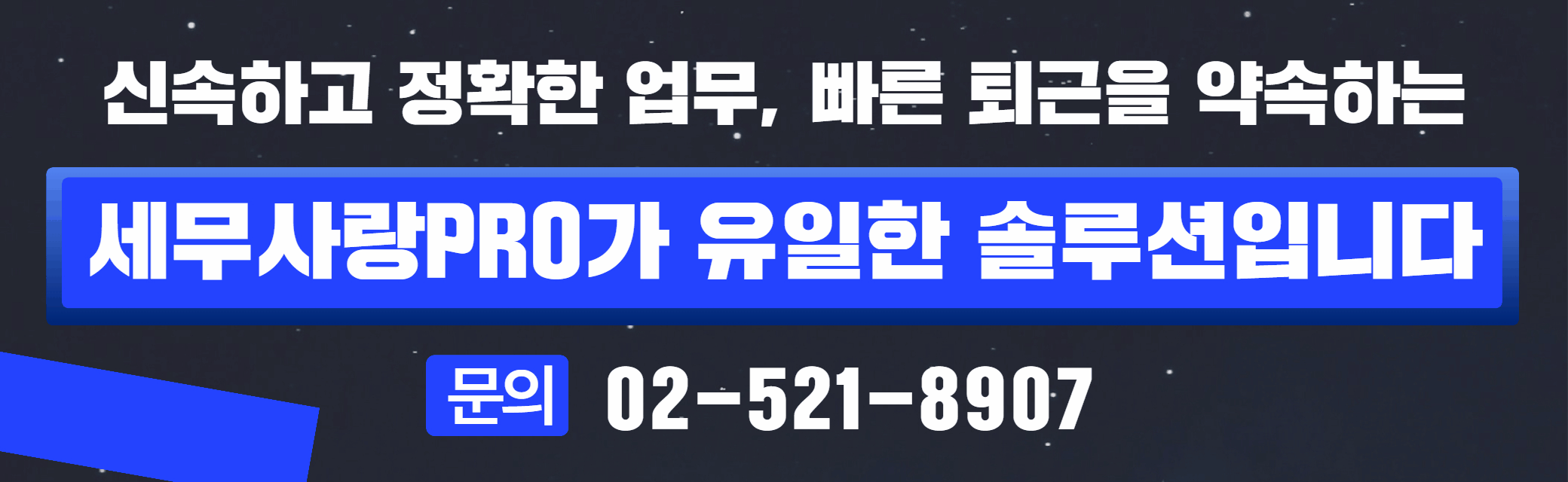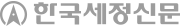조성기(한국대학생알코올문제예방협회장, 아우르연구소 대표/경제학박사)

최근 주류정책 이슈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주류광고 금지, 수제맥주 통신판매 허용, AI 주류자판기 허용 문제다.
업계도 정부도 이를 사유재산 침해, 일자리 창출, 성장의 이익 등을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이는 “과연 우리나라에 주류정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낳는다.
주류문제에 대한 글로벌 표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입장이다. 세계보건기구의 암연구소는 술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각 국 정부가 음주폐해를 줄이는 정책을 선택하도록 요청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에 근접했고, 구매력 평가기준 인당 국민소득(생산성)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를 능가한 선진국이다. 이는 국책의 선택기준이 국민행복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주류정책은 앞뒤가 맞아야 한다. 보건당국이 술 문제를 없애는 정책 방향을 택할 때 경제당국이 성장과 일자리를 추구한다면 정책이 사라진 정부가 되고 만다. 국가정책의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뜻이다. 국민들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춰야 할까.
정부는 최근 성장을 향한 규제 완화를 주류정책의 기준으로 잡는 분위기다. 생산과 유통부문의 규제 완화를 꾸준히 추진했다.
소매는 오래전에 의제면허로 누구나 술을 팔 수 있도록 했다. 통신판매도 계속 완화 중이다. 공공앱 등 새 기술도 받아들이려고 한다. 결과는 과당경쟁이다.
최근 통계를 보자. ‘술에 취해도 된다’는 국민이 36.2%다. 알코올 소비량은 세계 평균의 두 배나 된다. 월 1회 이상 폭음자가 남성은 52.7%, 여성은 25.0%에 달한다. 청소년은 10명 중 1명이 월 1회 이상 위험음주를 경험한다. 청소년의 51.3%가 위험음주자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의 파랑새플랜 2020도 선언적 의미가 있을 뿐 실제 효과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를 정책의 부재, 정책당국자들의 전문성 부재라고 학계는 지적한다.
식품위생법에서 술을 식품이라 정의함도 문제다. 보건복지부가 발암물질이라 해도 아랑곳하지 않는 부처가 많다. 산업부도 규제를 없애고, 기재부나 국세청은 발암물질의 수요를 늘리며 일자리 창출에 나서는 셈이다.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생산단계에서 주세를 강화하고, 도매유통을 지역별로 재규제하고, 소매의 시간, 장소 접근성, 만취상태 소비자 규제를 강화함이 옳다.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청소년보호법의 규정들도 더 강력히 개정하고, 생산·유통·소비 경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술에 대한 정의는 물론 주류정책을 다잡아야 한다. 주류산업이 규제대상 산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교육당국은 학교 예방교육을, 보건당국은 기획부처와 함께 규제제도를 재정비하자. 정부 부처 중 보건당국을 국가 주류정책의 책임부처로 자리매김하자. 주류판매 촉진정책을 선호하는 기재부나 농식품부가 주류정책을 주도해서는 주류문제가 줄지 않는다.
주류정책은 음주를 절제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방향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주세도 용도를 알코올 문제를 줄이는 데에 국한해야 공감대가 선다. 전통주 등 산업의 진흥도 국산 원료를 사용하거나 중소규모를 전제로 제한해야 한다. 산업 보호의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탈이 없다. 수제맥주 와인 등의 온라인 판매를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허용할 때의 대가는 국민건강의 소실이다.
건강 중심 규제를 국민이 원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소위 혁신과 성장을 위해 포기해서는 안될 일이다. 국민의 행복을 원한다면 국민 건강에 직격탄이 되는 주류 성장정책을 정책기조로 잡지 말아야 한다.
※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