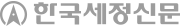우리나라도 상속세법 개정시 일본처럼 증여시기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일본은 유류분 계산시 생전에 유증·증여받은 재산(특별수익분)을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가산했으나 법 개정을 통해 ‘10년 동안’으로 제한했다.
김정식 세무사(세무학박사)는 계간 세무사 봄호에 실린 ‘일본 개정 민법(상속법) 상의 특별수익분 및 유류분 등에 관한 고찰’에서 일본의 상속관련 제도 변화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일본 민법은 고인이 상속재산 분할시 특별수익분을 포함하지 않도록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생전에 유증·증여한 재산(특수수익분)을 순수 상속재산과 합쳐 재산분할을 하지 말라는 유언을 했다면 그대로 따르도록 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배우자 A씨와 두자녀 B·C씨를 둔 고인이 생전에 자식 C씨에게 丁부동산(평가액 2천만엔)을 유증하면서 “丁부동산은 상속재산의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말라”는 문구를 유언서에 기재했다.
이 경우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유증한 丁부동산이 제외되고 고인이 남긴 甲부동산 6천만엔, 乙부동산 2천만엔, 丙그림(서화) 2천만엔 등 1억엔이다. 여기에 각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곱하면, 배우자 A씨는 5천만엔(1억엔×1/2), B·C씨는 각각 2천500만엔이 된다.
C씨의 입장에서 보면 유증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유증재산가액(丁부동산) 2천만엔을 더 받는 꼴이 돼 상속받은 재산가액은 4천500만엔이 된다. 여기에는 유증뿐만 아니라 C씨가 생전에 증여받은 금액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
반면 유언이 없었다면 분할대상이 되는 상속재산가액은 丁부동산을 포함한 1억2천만엔이 되고, 각자의 상속분을 곱해 배우자 A씨 6천만엔, B씨 3천만엔, C씨 1천만엔(丁부동산 2천만엔 제외한 금액)이 된다.
김정식 세무사는 “일본의 개정 전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 중 증여·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특별수익분)로서 자기의 상속분에 부족분이 발생할 때 그 부족분은 증여·유증을 받은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는 오로지 상속인 간의 공평에 초점을 맞춘 법률적 제도로,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개인 소유재산의 처분권을 법률이 제한하는 꼴이 된다”며 우리나라 역시 민법 개정시 이 점을 숙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또한 일본은 혼인기간 20년 이상 배우자 간의 주택 증여를 특별수익분으로 취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 사이에 살고 있던 주택을 증여·유증하면 그 주택은 특별수익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상속인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문은 ‘간주’가 아니라 ‘추정’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배우자 거주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규정이다.
여기에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간의 거주용 주택 증여는 기초공제액 110만엔과 별도로 추가 2천만엔까지 배우자 공제를 허용하는 특례규정이 시행 중에 있다.
유류분제도도 개선됐다. 법 개정 전에는 유류분 계산시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는 특별수익분은 그 받은 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가산됐으나, 10년 동안으로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김 세무사는 “증여시기가 오래된 것은 기억하기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비가 특별수익분인지에 대한 해석을 놓고 논란이 적지 않다”며 “일본은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상속법 개정때 증여 시기에 관한 개정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