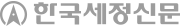자녀장려세제가 노동 공급 감소 등 부작용을 발생하지 않고 자녀양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31일 재정포럼 12월호에 실린 ‘자녀장려금이 출산 후 가구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분석’에서 자녀장려세제가 첫째 아이 출산 직후 가구의 동적인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도입했는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경감을 위한 조세제도로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이 있다. 그 중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자녀양육을 보조하기 위해 2015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자녀장려세제에 대해 보조금 형태의 현금지원보다는 가구의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진단했다. 자녀장려세제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일정한 수급구간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등과 같은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 지원정책은 여성의 노동 공급을 줄일 우려가 있다,
첫째아 출산 3년 전부터 출산 이후 1년까지(영아기) 가구노동공급 및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녀장려금 도입은 가구의 뚜렷한 노동 공급 증가·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母)의 노동공급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고 부연구위원은 “조세정책을 통한 지원이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비효율성 발생을 줄이면서 자녀양육비용을 보조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성 노동 공급의 감소가 나타나더라도 재정정책을 통한 현금성 지원정책은 여전히 의미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현금성 지원이 목표하는 아동발달·복지 측면에서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수단 및 지원정도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저소득층은 육아휴직 등의 사용이 어려워 자녀양육과 노동시장 참여를 병행하기 위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적인 정책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또한 출산 여성의 건강 상태, 조부모 등 보호자와의 거주지 거리 등으로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부모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또한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