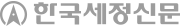“책상은 마련했지만, 납세자는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A지방국세청 과장으로 퇴직한 B세무사(58세)는 개업 몇달만에 현실의 벽을 실감하고 있다. 자동자격으로 세무사 등록은 쉬웠지만, 일감 확보는 녹록지 않았다.
매년 6월말과 12월말경이되면 국세청 퇴직 간부들의 세무사 개업이 이어진다.
국세청 경력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던 제도는 2000년부터 폐지됐다. 다만, 폐지 이전 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일정 요건(10년 이상-사무관 이상 5년 이상)을 충족한 퇴직자는 지금까지도 자동자격을 부여받고 있다.
아직 자동자격 부여 대상이 되는 이들은 현재 50대에서 60대 초반, 대부분 정년을 몇년 앞두고 있다. ‘자동자격의 끝물’에 서 있지만,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고 한다. 현실 역시 냉혹하다. 경기침체와 시장 포화로 신규 개업의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래처 인수’라는 변칙에 눈을 돌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비용문제, 유지율 및 탈락율, 수익성 문제 등으로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힘든 모습이다.
국세청에서 퇴직한 지방의 한 세무사는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으로 거래처라도 사야 개업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게 현실”이라며 “그렇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이후에 어느 정도 부실이 있을지 걱정돼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심경을 전했다.
퇴직 후 개업을 앞둔 세무서 고참급 한 직원도 “이제 개업은 ‘안정된 노후’가 아니라 ‘경쟁의 시작’이 됐다”라며 “세무행정 경험을 살려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라고 말했다.
공직 퇴직 세무사들의 역할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들리지만, 해결책으로는 아직 멀어 보인다.
모 세무사는 “세무사 시장은 이미 구조조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기장 대리나 신고 대행을 넘어 디지털 기반의 경영 컨설팅, 조세정책 자문 등으로 전문성을 확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퇴직 후에도 세금과 씨름하는 이들의 모습은 ‘황혼의 개업’이 아닌 ‘생존의 출발선’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