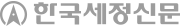"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기준금액을 현재의 50만원에서 10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접대비실명제가 기업의 영업활동과 내수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재계의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제도상의 개선을 추진할지 주목된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들 내부에선 접대비실명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업무관련 입증대상 금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소개하고, "업무관련성 입증대상 기준금액은 100만원이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대다수 기업들이 접대비실명제를 회피하기 위한 새로운 접대비 처리 관행을 만들 것이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접대비실명제 회피방법으로 영수증 쪼개기를 비롯한 통신카드 등 대체지불수단 이용, 타 카드사 공유 등의 방법이 동원될 것 같다"고 말해 이의 개선을 적극 요구했다.
이 관계자는 또 "접대비실명제로 인한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접대상대방의 신분노출 기피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업무관련성 입증 기준금액이 최소 100만원이상으로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접대비실명제 집행기관인 국세청도 재계의 이같은 요구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으나, 업무관련성 입증 기준금액 상향 조정에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李周成 국세청장이 지난 17일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결산보고에서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의 대기업과 가진 자의 민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현행 접대비실명제 기준금액 50만원을 상향 조정할 의향이 없느냐는 질의에 대해 시행 1년이 넘은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있다는 답변이 전부였다.
李 청장의 이같은 답변은 한번 도입된 제도가 조령모개(朝令暮改)식으로 자주 바뀌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혼란의 소지가 적지 않을 것이란 해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李 청장은 "건당 20만원미만인 문화접대비 등은 기업의 내실있는 경비지출을 유도하는 것으로 접대비실명제 범주는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해 상품권 등과 함께 문화접대비 부분과 관련, 실명기준금액의 상향 조정 을 검토할 가능성도 없지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