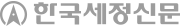부자증세가 정치권의 화두로 부각하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라면 ‘부유세’, ‘버핏세’ 등 어떠한 방식이든 부자증세안 도입이 유력해 보인다.
사실 부자증세의 한 방안인 ‘부유세’는 지난 2004년 민주노동당에서 부자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며 도입을 주장했지만 소수 의견으로 큰 이슈로 부각되지는 못했다.
참여정부 출범이후 종합부동산세라는 부자증세안이 도입됐으나, 이 역시 MB정부 출범이후 납부대상이 완화되면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왔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버핏세는 미국의 투자가이자 억만장자인 워런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연 수입 100만 달러이상의 부자들에 대한 증세를 통해 재정위기를 돌파하라’고 제안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 부자증세안에 대해 이중과세, 국부의 해외 유출 등 부정적인 의견이 제기되면서 ‘뜨거운 감자’로 취급돼 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재정위기 속에 워런버핏의 말 처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어 재정위기를 돌파하라’는 말은 의미심장한 메시지로 여겨진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해 오다 부자증세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간의 회동에서는 소득세 최고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세율을 올리는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해 당·청 간 추가 협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정책변화가 세계적 흐름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지만,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자증세 안에 대해 씁쓸한 면도 없지 않다. 바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눈치보기 정책이 아니냐는 것이다.
사실 정부는 최근까지 재정위기 타개책으로 부자증세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26 보궐선거에서 복지를 최우선과제로 내건 시민단체의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정치색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분명, 부자증세는 서민복지를 위한 재정확보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는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수년간 야당에서 줄기차게 주장해온 부자증세안을 정치논리로 인해 정부에서 슬그머니 꺼내드는 것은 좋은 모양세가 아니라는 것이다.
부자증세는 부유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이왕 시동이 걸린 부자증세안의 당위성에 대한 철저한 논리와 설득을 통해 사회양극화 해소 등 우리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