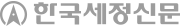박근혜 정부들어 첫 국세청장에 오른 김덕중 청장의 인사 스타일은 비교적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부산지방국세청에서는 인사와 관련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져 주위를 어리둥절케 하고 있다.
부산청에 근무하던 한 서기관은 국세청 고위층 인사가 단행되기 이전부터 전 L․K부산지방청장에게 2013년 6월말로 앞당겨서 명예퇴직을 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현재의 보직에서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 4월말 갑작스러운 서기관 인사에서 보직이 변경되자 미련없이 사표를 냈다고 한다.
지방청이다 보니 인사권자의 의중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고, 인사를 하다 보면 의도치 않은 실수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서기관이면 흔히 외부에서 말하는 고위직 공무원이다. 인사권자인 국세청장이 ‘몰랐다’ ‘실수다’는 말로 넘어가기는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당사자에게서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당사자 역시 어떤 업무상 실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인사규정상 불가피성도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 정도면 인사규정은 중요치 않다. 2개월 뒤에 현 보직에서 명예퇴직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박정하게 거절한 인사권자에 대해 ‘너무 매정하다’는 원망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서 “국세청에 청춘을 바친 대가치고는 너무나 혹독하다”는 넋두리가 나왔다. 그것도 본인이 아닌 주변 동료들의 탄식이 더 깊다. 어떤 직원은 “나의 미래일까 두렵다. 평생을 몸바친 결과가 저렇게 허망하게 쫒겨나는 건가”면서 “명예퇴직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볼 때 자진해서 기간을 앞당겨 명예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마지막 명예도 지켜주지 않는 직장이 국세청인가 싶어 정말 답답했다”고 심경을 전한다.
여기서 어느 한 개인의 인사 상 불이익을 따지고자 함이 아니다. 국세청에 40여년을 몸담았으면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큰 사고없이 무탈하게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게 됨을 모두가 축하해 주고 석별의 정을 나누는 것이 오랜 전통인 걸로 안다. 그런데 최근에는 퇴임식을 하지 않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라고 한다. 명칭은 명예퇴직인데 당사자는 ‘명예’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의 명예퇴직인 것이다.
인사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퇴임식도 없이 40년 정든 직장을 떠나는 반백의 뒷모습은 참 우울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