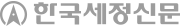“도대체 ‘기증 여여부’가 무슨 말이고, 또는 ‘부’는 무슨 뜻인가?”, “아마 기증여부를 잘못 쓴 것 같은데 세무서도 아니고, 국세청에서 인쇄해 전국으로 보내는 안내문에 이런 오류가 있다니 한심하다.”
잘 아는 납세자가 기자에게 문의할 것이 있다며, 국세청에서 보내온 증여세 신고안내문을 들고 찾아왔다.
안내문을 자세히 살피니, ‘기증여여부’라고 표시된 칸이 있었고, 그 아래에 ‘부’라는 표시가 있었다.
‘기 증여 여부’를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바람에 납세자는 ‘기증 여부’로 오해한데 이어, ‘기증 여여부’라고 잘못 표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반국민들은 세무용어나 세법이 너무 어렵다고 불평을 많이 하는데, 어려운 용어마저 이렇게 어법이나 띄어쓰기를 무시하고 사용하는 바람에 납세자들은 더욱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안내문의 취지대로 한다면, ‘기 증여 여부’라는 표현도 어법에 맞지 않다.
해당 안내문은 증여자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게 보내는 서류인 탓에 수증자의 입장에서 작성되어야 합당하다.
결국, ‘기 증여 여부’가 아닌 ‘과거에 증여받는 사실이 있는지?’라고 표현하면 납세자는 더욱 정확하게 이해할 것이며, ‘여부’를 표시하는 난에도 ‘○’또는 ‘×’로 표시하면 이해가 훨씬 빠를 것이다.
국세청이 발송한 각종 안내문이나 통지서를 보면 이같은 잘못된 관행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몇 년 전 세무서에 탈세제보를 한 납세자는 “조사결과 피제보자에게 92백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도대체 구십이백만원이 무슨 말이나?”고 물었다.
추징할 세액이 구천이백(9천200)만원이라고 설명했더니, 납세자는 “그러면 9,200만원이라고 적으면 될 일을 왜 92백만원이라고 적어서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92,000,000이라고 다 적어주던지...”라며 투덜거렸다.
사실 한글맞춤법상으로도 숫자를 한글과 혼용해 사용할 때는 만, 억, 조 단위로 띄어 쓰도록 하고 있다. 내부보고서 작성시 또는 숫자로만 적을 때 서양식 회계단위인 천, 백만, 십억, 조 단위로 적는 습관을 납세자에게 보내는 문서에게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전문용어가 생활화 된 공무원과는 달리 일반 납세자의 입장을 헤아리는 시각의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