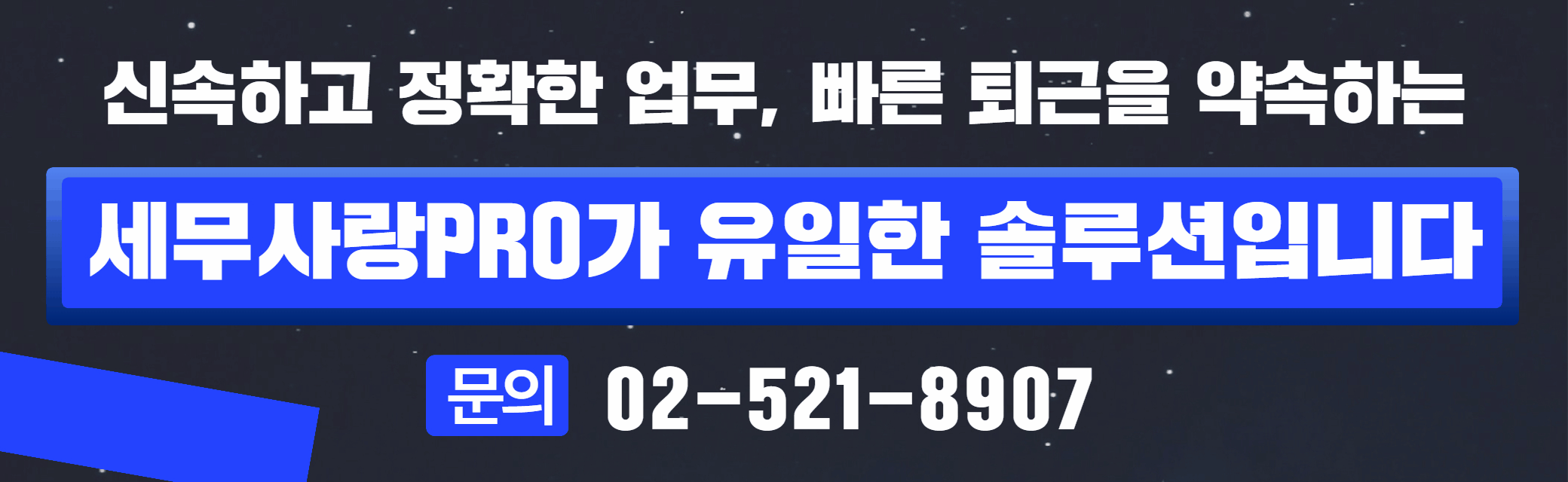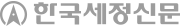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외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외로움은 단순히 곁에 사람이 없을 때만 찾아오는 감정이 아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문득 혼자인 듯한 느낌이 오래 마음에 머무를 때, 우리는 스스로를 외롭다고 말한다.
외로움과 고독은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르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S. 와이스(Robert S. Weiss)는 외로움을 “필요로 하는 관계망의 부재(absence)”로 정의하며, 이를 인간이 겪는 고통스러운 정서적 반응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외로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하나는 친밀한 애착 대상이 없을 때 느끼는 ‘정서적 고립(Emotional isolation)’이고, 다른 하나는 소속된 공동체가 없을 때 느끼는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이다.
반면 고독(Solitude)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혼자 있음’의 상태다. 실존주의 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인간이 혼자 있다는 것의 두 얼굴을 날카롭게 포착했다. 그는 “우리의 언어는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해 ‘외로움(Loneliness)’이라는 단어를 만들었고, 혼자 있는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 ‘고독(Solitude)’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고 명시했다. 틸리히의 관점에서 고독은 단순히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타인이라는 외부 소음에서 벗어나 나 자신, 그리고 존재의 본질과 깊이 만나는 ‘승화된 시간’이다. 감정이 세차게 흔들릴 때 스스로를 다잡고, 복잡하게 엉킨 생각을 정리하며,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여백을 만들어주어 삶을 다시 정돈하게 하는 시간이다.
고독이 스스로 선택한 시간이라면, 삶을 흔드는 감정은 대개 외로움에 가깝다.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외로움을 전혀 경험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드물다. 표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외로움을 안고 살아간다. 외로움은 인간에게 매우 보편적인 정서이기 때문이다.
필자 역시 어린 시절 외롭다는 느낌이 들 때면 친구를 일부러 불러 함께 놀거나 공부했던 기억이 있다. 중학교 3학년 때 비평준화 지방 고등학교 진학을 고민하다가 집을 떠나는 일이 두려워 포기했던 일도 있었다. 돌아보면 그 선택의 밑바탕에는 ‘외로울 것 같다’는 막연한 두려움이 놓여 있었다.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은 예전만큼 선명하지는 않지만 완전히 사라진 적도 없다. 달라진 것은 감정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태도다.
비 오는 주말 오후, 일부러 혼자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상영이 끝난 뒤 극장을 나서며 묘한 독립감을 느꼈다. 혼자 식당에 가는 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외로움은 조금씩 다른 얼굴을 갖게 되었다.
문제는 외로움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심리학은 이 지점을 중요하게 본다. 인지행동치료(Cognitive Behavioral Therapy, CBT)는 우리를 흔드는 것이 사건 자체라기보다 그 순간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설명한다. 같은 ‘혼자 있음’이라도 “나는 혼자다, 나는 버려졌다”라고 해석하면 슬픔과 불안은 커진다. 반면 “지금은 나를 정리할 시간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전혀 다른 정서가 나타난다.
외로움이 만성화되는 경우에는 “나는 결국 혼자일 사람이다”, “사람들은 결국 나를 떠난다”와 같은 자동적 사고가 반복된다. 이러한 생각은 외로움을 증폭시키고 관계 회피나 과도한 의존으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일이 아니라,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생각을 차분히 들여다보는 일이다.
수용전념치료(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 ACT)는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불편한 감정을 제거하려 할수록 오히려 강화된다고 본다. 외로움을 ‘나쁜 감정’으로 규정하면 우리는 그것과 싸우게 되고, 그 싸움은 또 다른 긴장을 낳는다. 오히려 “외로움이 와도 괜찮다”는 태도가 출발점이 된다. 외로움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감정을 몰아내는 대신, 감정과 함께 서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로움을 느끼되 그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 혼자 있을 때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함께 있을 때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이다.
배고픔이 몸의 신호이듯, 외로움은 마음이 보내는 신호에 가깝다. 지금의 관계가 나에게 맞는지,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가 느슨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는 신호다. 무조건 없애려 하기보다 잠시 멈춰 그 의미를 살피는 태도가 필요하다.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삶, 고독을 견디되 고립으로 흘러가지 않는 태도, 성숙한 삶은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한다. 외로움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우는 표식이다.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때, 외로움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감정이 된다.